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침묵의 영역이다. 2018년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선정작인 본 전시는 이러한 집단적 회피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 기획되었다. 금천예술공장 PS-333의 거친 물성 위에 소멸과 부재의 서사를 구축하고, 관객이 죽음을 막연한 공포가 아닌 감각 가능한 현실로 마주하게 했다. 죽음의 인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생생함(레몬향기)을 환기하고자 했던 전시 기획의 기록이다.
Project: 제4기 서울 시민큐레이터 기획 공모 선정작
Role: Exhibition Directing & Curation
Credit: 주최: 서울시립미술관(SeMA) / 기획: 엄용선
Venue: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PS-333
Artists: 김도영, 신제현, 윤여선, 전은숙, 최 선, 홍부용
제4기 서울시민큐레이터 기획전 (서울시립미술관 지원작)

Curatorial Note: 우리는 왜 죽음을 외면하는가?
현대 사회에는 더 이상 터부가 없다. 동성애, 이데올로기, 종교에 대한 도전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죽음’만은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침묵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이 명징한 진리를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애써 외면하며, 타인의 죽음은 가십으로 소비하고 자신의 죽음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유예한다.
“죽음을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구조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전시 <레몬향기를 맡고 싶소>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집단적 회피에 질문을 던진다. 죽음이 주는 막연한 공포나 무지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이를 ‘나의 문제’로 직면할 때 삶은 비로소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전시명은 죽음의 비릿함이 아닌, 삶의 생생한 감각(레몬향기)을 역설적으로 은유한다.
Space & Artworks: 공간 구성과 작품
본 전시는 금천예술공장 PS-333이라는 날것의 공간 위에 소멸과 부재의 서사를 입혀, 관객이 죽음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시는 ‘죽음’이라는 추상적 담론을 시각, 청각,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감각 가능한 구체적 현실로 재구축했다. 소멸(청각)에서 시작해 부패(시각)를 지나 부재(체험)에 이르는 서사적 동선의 설계는 죽음의 여러 층위를 단계적으로 마주하게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사라진 도시의 소리부터 육체의 물성, 그리고 스스로의 영정을 기록하는 행위까지. 6명의 참여 작가(김도영, 신제현, 윤여선, 전은숙, 최 선, 홍부용)는 설치, 회화, 사운드, 프로젝트 등 각자의 매체를 통해 죽음의 양면성을 공간에 입체적으로 구현해냈다.
Section A. 소멸의 소리 (Sound of Extinction)

전시장 입구, 거대한 원형 구조물에 매달린 낡은 기타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 악기들은 지난 10년간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파괴된 지역에서 수집된 것들이다. 작가는 알파벳 ‘DEAD’가 계이름 ‘레(D)-미(E)-라(A)-레(D)’와 대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직 7개의 음계(A~G)로만 구성된 300개의 단어로 ‘죽음에 대한 시’를 썼다. 그리고 이를 음계로 치환하여 모터 장치를 통해 스스로 연주되게 설계했다. 1분에 한 바퀴씩 회전하며 연주되는 이 둔탁한 공명은, 도시의 개발 논리 속에 밀려나고 사라져간 수많은 존재들의 비명이자 그들을 위한 진혼곡이다.
Section B. 육체의 물성과 부패 (Materiality & Decay)

바닥에는 하얗게 드러난 동물의 뼈들이 산재해 있다. 작가는 돼지 기름, 피, 침 등등. 부패하고 소멸하는 재료들을 통해 예술이 추구하는 통념적인 영원성과 아름다움에 반기를 든다. 가장 적나라한 육신의 마지막 형태인 ‘뼈’를 통해, 관객은 소멸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Section C. 이미지와 경계 (Image & Boundary)
삶과 죽음은 명확한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그 사이에는 무수한 회색지대, 즉 정의되지 않은 경계(Boundary)가 존재한다. 이 섹션에서는 회화와 조형이라는 시각 언어를 통해 그 모호한 임계점을 포착한 세 작가의 시선을 따라간다.

먼저 전은숙은 <베스트셀러 소나무>를 통해 회화를 대상을 재현하는 도구가 아닌, ‘껍질을 깎아내는 행위’로 정의한다. 캔버스 위에 부유하는 이미지는 살아있는 것인지 박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생동도 부동도 아닌’ 제3의 상태를 시각화하며, 관객에게 실존의 껍질과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불확실한 경계는 윤여선의 <죽음의 바다(Dead Zone)>에 이르러 시공간의 층위로 확장된다. 작가는 오랫동안 천착해 온 ‘유목(Nomad)’의 시선을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투영했다. 소멸과 생성이 뒤엉킨 5점의 신작 페인팅과 6점의 설치 연작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닌, 또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자 ‘영원한 유목’의 과정으로 사유하게 한다.

시선은 다시 내면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옮겨진다. 김도영은 <부동성의 고통>을 통해 죽음을 개인의 종말을 넘어선 시대적 현상으로 포착했다. 작가는 사회의 틈새와 굴절된 구조 속에 갇혀버린 ‘부동(Immobility)’의 상태를 조형적 언어로 형상화하여,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동시대의 ‘사회적 죽음’과 그 풍경을 날카롭게 환기시킨다.
Section D. 부재의 기록과 대면 (Record & Confrontation)

전시장 내 별도로 마련된 독립된 공간에서는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관객은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영정사진을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남긴다. “내가 죽은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스스로의 부재(Absence)를 가정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관객은 막연했던 죽음을 구체적인 현실로 인식하며 현재의 삶을 환기하게 된다.
Epilogue: 와전된 죽음과 여전히 남은 질문
‘레몬향기를 맡고 싶소’라는 전시의 제목은 소설가 이상(1910-1937)의 죽기 전 마지막 말에서 따왔다. 하지만 나는 곧 그것이 ‘레몬’이 아닌 ‘메론’임을 알게 된다. 후에 이상과 결혼했던 변동림이 본인임을 밝혀 화제가 되었던 김향안(1916~2004, 김환기 화백의 부인)의 저서 ‘월하의 마음’에는 이상에 대한 구절이 종종 나온다. 특히 그가 죽기 전 남긴 유언으로 알려진 ‘레몬향기를 맡고 싶소’에 대해 그녀는 세간의 이 말이 실은 와전된 것이라 전한다. 병원에 있는 그를 찾아가 ‘무엇이 먹고 싶어?’라 물으니 ‘셈비끼야이 메론’이라고 했다나 뭐라나. 아, 레몬이 아니라 메론이라니! 그것은 와전된 죽음과 같다.
본 전시에서 관객들은 <어쩌면 피상적일 ‘죽음’에 대한 담론>을 통해 ‘죽음’이라는 미지의 두려움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가져간 것은 ‘삶’에 대한 의지였다. 죽음의 불확실성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 동력이 되기를 바랬다.
“당신의 삶은 죽음이라는 마침표 앞에서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전시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Collaboration]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공간에 구축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철학과 서사가 흐르는 ‘의미의 공간’을 기획합니다.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포착하여, 관객이 머무르고 사유할 수 있는 밀도 높은 공간 서사를 설계합니다.
- 전시 및 공간 기획 (Space Directing): 기획 의도와 공간의 물성을 결합하여,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전달되는 최적의 동선을 설계합니다.
-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Narrative Design): 예술, 브랜드, 장소에 담긴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공간에 깊이 있는 인문학적 층위를 입힙니다.
- 전문 디렉터의 인사이트 (Insight & Curation):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정제된 감각으로, 클라이언트의 비전을 구체적인 공간 언어로 형상화합니다.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입니다.
깊이 있는 기획과 섬세한 연출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에 독보적인 사유의 구조를 제안합니다.
전시 기획, 공간 스토리텔링, 브랜드 공간 컨설팅 및 아트 디렉팅
Life Architect, EOM YONG SUN
삶의 밀도를 짓고, 시간의 결을 수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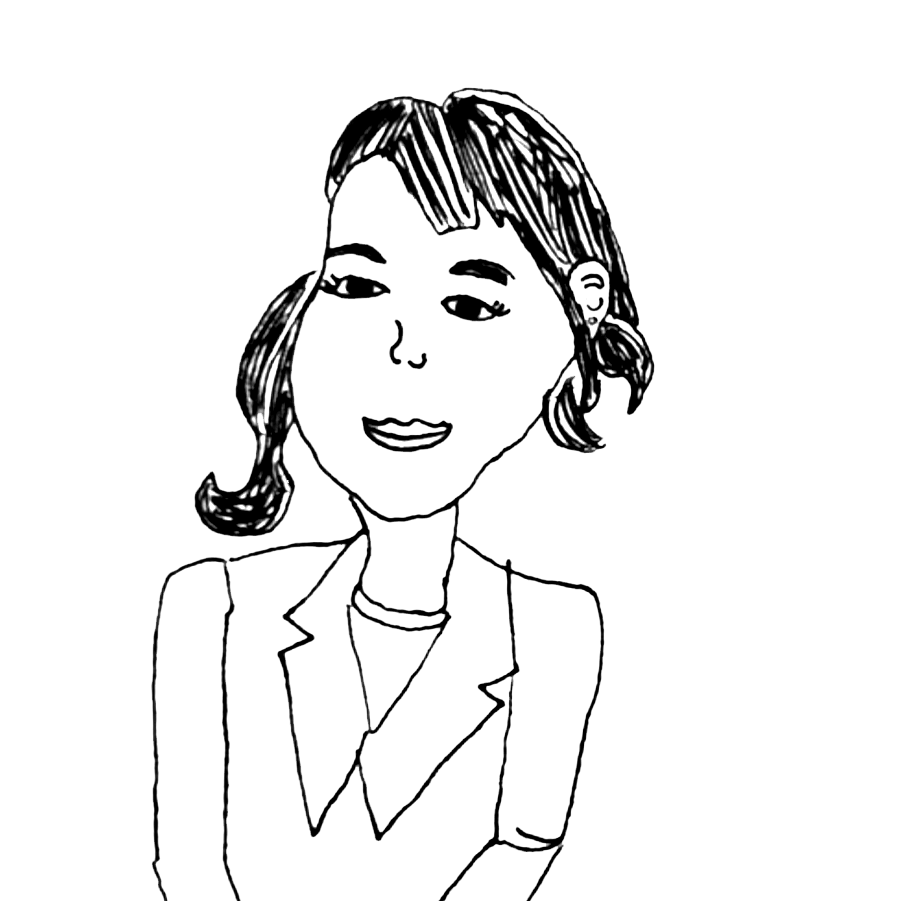
Leave a Reply